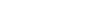글로벌 신문사, 책임감 하나로 버텨와

드디어 3년간의 신문사 생활을 마친다. 이제 더 이상 수습기자 모집도, 지면을 뭐로 채울지에 대한 고민도 안 해도 된다. 선배들이 말한 ‘시원섭섭한’ 기분을 알 것 같다. 처음 신문사에 오게 된 이유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였다. 다들 그렇듯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에 자신이 있는지 알기 힘들었다. 신문사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는 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신문사를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마치 전문기자가 된 듯 학교 수업에 충실하지 못하기 일쑤였고 당장의 신문 기사가 최우선, 주객이 전도됐다. 내게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됐다. 이러한 이유들로 계속 신문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나의 동기들은 모두 떠났고 ‘책임감’ 하나로 지금까지 오게 됐다.
그럼 과연 신문사를 계속 한 것이 후회가 되는가. 결론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3년이었다. 어리바리한 수습기자부터 어느새 후배의 기사를 봐주는 편집국장이 되기까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로 힘들기도 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 또한 딱딱했던 신문사의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성숙해졌다고 하고 나도 내가 많이 자랐다고 생각한다.
내게는 6명의 어벤저스 36기 후배기자, 열심히 배워가는 37기 수습기자 2명이 있다. 힘든 순간 내게 조용히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후배들. 항상 잘하고 있다고 조언해준 선배들 그리고 오대영 교수님, 남경민 간사님께서는 혼자 신문사를 이끄는 내게 무한한 격려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여주셨다.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고마운 사람들로 남아있을 것이다.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내가 그 선택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클지, 잃는 것이 클지는 겪어봐야 알고 그것을 감수해야만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경험은 없고 언젠가 그것이 큰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잘 모르겠다면 무엇이든 해봤으면 좋겠다. 이 점을 명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었듯 내가 먼저 손을 내밀 테니 함께 나누었으면.
소중한 경험으로 채워 온 메디컬 학보사
 내가 학보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정말 별것이 아니었다. ‘어쨌든’ 글을 쓰는 동아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하던 걸 이어가고 싶었다.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린 시절 작가를 꿈꿨던 걸 이렇게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같다. 기획부와 취재부의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도망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내 이름 석 자가 들어간 기사가 남는다는 게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학보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정말 별것이 아니었다. ‘어쨌든’ 글을 쓰는 동아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하던 걸 이어가고 싶었다.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린 시절 작가를 꿈꿨던 걸 이렇게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같다. 기획부와 취재부의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도망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내 이름 석 자가 들어간 기사가 남는다는 게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직함을 달고 퇴임의 변을 쓰며 임기를 마무리 하는 건 아직도 어색하기만 하다. 내부 사정으로 2학년 데스크를 구성하며 어떤 직함이 어떤 일을 할지 나누고, 1지망에서 4지망까지 적어서 한 번에 내밀기로 했다. 충동적으로 1지망에 국장을 적어 내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수습기자에서 어엿한 정기자가 되기까지 함께한 현정 선배(2016년도 편집장)처럼 되고 싶었다. 모두 다른 1지망을 씀에 따라 각자 자신의 선택에 따른 역할을 맡게 됐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다. 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선·후배 대면식 세 번, 전시회 두 번, 신문 열여덟 번으로도 환산 가능하다. 수치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슬픈데, 신문 하나를 펴내기까지 최소 두 번의 회의와 한 번의 조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면 조금 위안이 될 것 같다.
사실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한 학기 먼저 국장 직함을 달고 반쪽짜리 국장으로 살면서 그리고 정식으로 임명을 받고 국장이 돼서도 말이다. 시도한 결과가 항상 좋을 수는 없다지만 투자 대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억울했고 그렇다고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마저도 서러웠다.
그래도 좋을 때가 더 많았다. 학보사를 한다는 것 자체로, 내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내 손을 거쳐 신문에 실린 기사가 상단이든 하단이든 어딘가에 적힌 ‘손유현 기자’ 다섯 글자가 더할 나위 없는 성취감을 줬다. 학보사로 인해 알게 된 모든 인연의 소중함은 굳이 말해야 하나 싶을 정도다. 서툰 국장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은 선배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학보사를 지탱해 준 데스크들, 신문 기사가 꼬박꼬박 나올 수 있도록 도망가지 않고 함께해 준 후배들까지. 학보사에서 보낸 지난 3년이 지닌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
아끼는 후배들에게 첨언하자면 학교생활과 학보사 활동을 병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앞으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도, 다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좋을 때가 더 많을 것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유윤정·손유현 기자 gc5994@daum.net